■종교의 생성(生成)과 전화(轉化)
ㅡ 어떤 장소에 거룩한 의미부여 및 상징적 표현행위로 그곳이 성(聖, holy)스런 장소로 변모하게 되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자리잡게 되고, 그래서 그 거룩함을 시중을 드는 측근노예 (21C에도, 전광훈,김삼환, 김장환등은 지들이 '주의 종'이라고 말한다.)등을 내세우게 되고, 그에따라 하이어라키적 종교질서및 행위가 자리잡게 되었다.

제1장 담장과 이웃: 초기 유대교에 관한 몇 가지 윤곽
제2장 비교에는 주술이 살고 있다
제3장 성스러운 지속(持續):경전의 재(再)서술을 위하여
제4장 의례의 벌거벗은 사실
제5장 알려지지 않은 신: 역사 안에서의 신화
제6장 값비싼 진주와 한 바리의 dia: 상황적 부정합성에서의 한 연구
제7장 존스 씨 안에 있는 악마
■고대 로마 종교의 Sacra(성물), 신 숭배, 특히 희생과 기도와 관련된 거래행위였습니다.
▪︎ '사크라'(sacra)가 성스러운 것은, 그것이 위에서와 같이 성스러운 장소로 변모한 장소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ㅡ 성스러운 그릇과 보통 그릇 사이에 본래적 차이는 없다..)
'신화적 사고'(mythical thinking) 속의 '시대적 분위기'(atmosphere of the time)에서 나온, '작가적상상력'(Writer's imagination)에서 만들어진, 신(神, God)의 속성들 (personality, character, attributes).....
▪︎소위 성물들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소위 성스러운 장소에서 사용됨으로써 중요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고, 종교적 도구로서 유용성과 함께 System 확립의 .주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서문에 등장하는 "인간,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구인이, 종교(religion)를 상상해 온 것은 지난 몇 세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문장, →☆ 註 : 그 이전까지는 기존의 종교가 신(god)으로 부터 부여받은 권력으로 인식되어, 가타부타없이 순복(順服Obey)하고 있었기에 ....
▪︎그리고 바로 이어서 던지는 다음과 같은 주장일 것이다.
ㅡ "종교 그 자체에 해당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는 단지 학자들의 연구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ㅡ "종교는 분석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학자가 비교와 일반화라는 상상적 행위를 하면서 창출된 것이다.
(소위 말하는 고급)종교는 학문세계를 떠나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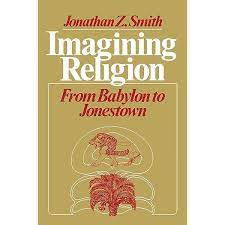
..... 시카고 대학 인문학 석좌교수 조너선 스미스(Jonathan Z. Smith)의
"종교 상상하기" (Imagining Religion and To Take Place) 중에서 .....
조나단 Z. 스미스(Jonathan Z. Smith)는 이 영향력 있는 에세이집을 통해
종교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새로운 이론적 방향,
즉 신학적이거나 고의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닌
새로운 이론적 방향으로 지적했습니다.
19세기 뉴질랜드의 마오리 숭배와 존스타운의 사건처럼 명백히 다양하고 이국적인 사례를 사용하여
종교가 관습적이고 인류학적이며 역사적이며 상상력의 행사로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분석에서 종교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위치한 인간의 독창성, 인지, 호기심의 산물로서 나타난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 노동의 결과로서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를 창조하는 결정적이지만
지극히 평범한 방식 중 하나이다. 그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일곱 편의 에세이는… . .
스미스를 오늘날 가장 방법론적으로 정교하고 암시적인 종교 역사가 중
하나로 만드는 비판적 지능, 창의성, 순수한 상식을 보여줍니다.
스미스는 종교 연구에서 분류와 비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정경과 의식과 같은 기본 범주를 암시적으로 재설명하며,
얼마나 자주 연구된 신화가 자랑스러운 모방적 일치보다 상황적 불일치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존스타운에 관한 그의 마지막 에세이는
우리 시대에 가장 이상해 보이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종교사가의 해석력을 보여줍니다.”
—Richard S. Sarason, Religious Studies Review
'나린푸실 이야기 > 신학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춘향전(春香傳)은, 신분평등을 내세운 기독교사상과 결합되어 나온 성서문학(Bible literature)이다. (0) | 2024.03.19 |
|---|---|
| ■그리스도의 교리가 희랍의 철학사상과 결부되어 있다. ■신앙은 사실에 오지 않고, (시대 시대마다의 사회적) 가치 판단에서 비롯된 것. (3) | 2024.01.30 |
| #신앙, #종교, #신학, #철학, #기독교철학 (0) | 2023.10.03 |
| 문맹자시대. 그 기간의 종교교육및 설교. (0) | 2023.09.16 |
| ■육체의 부활은 과연 가능한가? (0) | 2023.09.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