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학(神學: Theology, 신학하는 것)
1. 알리스터 맥그라스에 의하면, 기독교 신학을 정의한다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신(God)을 알기 위한 지적가치가 있고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비에 맞서 이성으로 씨름하는 일” 이다.
2. 신학이란, 우리로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것과 대면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손안에 있는 분석과 해명의 도구들을 이용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1] 인간의 이성으로 초자연적인 초월자의 신비함을 캐내는 일로 그 존재의 자연적이고 우주적인 경이함을 느끼는 엄청난 존재를 상상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그 존재를 알 수가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creator)라는 사실에만 머물지 않는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만물의 ‘통치자’(moderator)시며 ‘보존자’(conservator)이시다. 지으신 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고 한다. "지으신 분의 뜻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떨어지지 않는다(마 10:29)". 하나님의 섭리(攝理, providence)는 영원히 현재(顯在)하는 하나님의 손(칼빈, 기독교강요 1.16.1-1.18.4)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manus invisibilis Dei)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고 한다. 그러한 견해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마치 칼벵의 성시화 같은 신정정치(神政政治, theocracy)시대, 혹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던 왕(King)이나, 영주(Lord) 1人을 위해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던 민중들이 노예처럼 평생을 일해야 했던 킹덤(Kingdom)의 왕정정치 (Monarchy) 시대 분위기 속에서 나온 신학적 사고이다. 마치 시장 질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유지 된다는 민중의 삶을 무시하고 당시 부르조아들을 대변하던 아담 스미스의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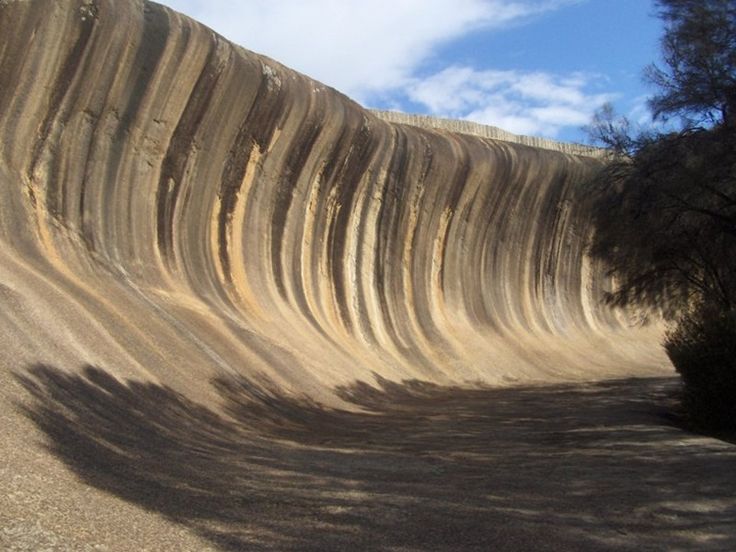
4. "신학"(Theologie)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가지 유형으로 해석된다. 보통 신학을 정의하자면, 하나님에 관한 학문(theos+logia) 이라 한다. 그 유형들은 첫째, 위로부터(from above)의 바르트의 <하나님 말씀(계시)에 대한 봉사를 말하는 정통주의적 계시라는 "하나님 맘대로 신학">으로... 두번째는, 아래로 부터(from below)시작되는 <어느 한 시기의 교회에 지배적인(Prevalent)교리로 체계화 되고 지배하게 되는 학문>으로 ... 세번째로, 작은자들의 삶의 자리인 바닥으로부터(from bottom)시작되는 구티에레즈가 말하는 <하나님나라를 위한 변혁적 실천에 대한 반성적인 숙고>이지만 신학적 개념보다 신학적인 실천이 훨씬 중요하다고 흑인 신학자 제임스 콘은 말한다.[2] 하지만 판넨베르크는 신학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언어 사용으로 본다면, “인간의 인식론적 노력이 깃들여져 있는 신학 대학에서 공부하는 훈련”을 가리킨다고 했다.[3]
5. 플라톤적인 근원에서 볼 때 신학(Theology)이란 이 단어는 “시인의 연설과 노래로 신성(神性)을 알리는 로고스(Logos)”를 일컬었다(Staat379a,5f.). 로고스가 반성적 연구가 아니었듯이, 신학도 반성적 차원에서 시작되지는 아니했다는 말이다. 로마를 비롯한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시리아 안디옥, 비잔티움등의 소위 정통이라 자처하는 곳의 리더쉽들에게, 논리적인 신학적 사고로 대항에 오는 영지주의자들에 방어하기 위한 그들만의 종교권력을 위한 논리적 구성을 세우기에 급급했다고 필자는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적 철학의 세 가지 훈련 중에서 이 한 가지를 "신학(철학)적 (Theological)"이라고 불렀다(Met 1026a 19와 1064b 3). 훗날 그가 "형이상학 (Metaphysics)"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모든 타자를 포괄하고 그 토대 위에 모든 존재들의 원리인 신성(divinity)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스토아 학자들은 철학자들의 "신학"이라는 점에서 Divinity의 본성에 속하는 이것을 시인의 신화적 신학으로 부터는 물론이고 국가적 예배의 정치적 신학으로부터 구별했다. 따라서 신학은 철학적 연구의 대상에서 나아가 그렇게 그 자체의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4]
6. 2세기에 등장한 기독교의 전통적 언어 관습은 철학적 경향이 농후했는데, 그 말의 의미 역시 다층적이었다는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디오니소스의 신화론’에 대해서 "무상(無常)하지 않은 로고스의 신학"을 대비시킨 것은(Strom Ⅰ,13,57,6) 단지 로고스 학설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로고스(常), 자체의 하나님 선포를 생각한 것이다(12,55,1 참조). 신학은 신적인 진리를 하나님에게서 영적인 감동을 받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교황과 교회의 봉건적-신정정치와 왕과 영주의 봉건적-왕정정치 시대에 까지 신학적 사고에 여전히 적용되었다.
7. 이로부터 천여년에 걸쳐서, 인간을 homo religious, 즉 <신앙하는 존재요, 신을 찿아가는 종교적 존재>로 인간을 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훗날, 프로히드가 인간을 homo desiderium, homo lubido, homo appetentia 등으로 규정했듯이, 욕구를 욕망하는 존재요,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존재인 Homo Sapiens(=wise man)였던 인간이, 서구 생활에 뼛속까지 침투한 기독교를 시작으로 homo religious로 바뀌어 살아가게 됬고, 이슬람학자들에 의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재생되어 나타난 르네상스로 말미암아 문예부흥과 교황을 대적할 수 있는 시대적 분위기가 형성되고(종교개혁) 그리하여 계몽주의에 의한 민중의 인권의식이 나타나게 되어 인간이 다시 Homo Sapiens(Homo Economicus)등으로 환원되어 오늘날까지 사회발전과 함께하고 있다.[5]
8. 그와 같은 인권회복의 발전과 더불어, 오늘날의 신학은 다변화 다층화 되어 있다. 그동안 근본주의 신학, 정통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 등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변천에 오고 있다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전후로 세속화신학, 성공(번영)신학, 해방신학, 흑인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등 그리고 공공신학, 생태신학, 환경신학 등으로 수많은 신학들이 분화하고 있다. 그런 신학들은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 등등의 신학자들은 꿈도 꾸어 보지 못했던 신학들이고, 위 신학들로 인해서 새로운 신학적 사고가 시작되고 발전하기 위해선, 꿈도 꾸지 못했던 그들이 주장하던 기독교 교리들 중에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많은 현대 신학들 중에서 신학도 변해야 한다는 까닭을 알게하는 과정신학(Process Theology)을 소개하고자 한다.

[1]알리스터 맥그래스, 기독교 신학이란 무엇인가(복있는사람, 2014, 원제 :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5th) 서문 중에서
[2] 윤철호,기독교 신학 개론(대한기독교서회, 2015, 서울)15-17
[3] W. Pannenberg, Systematische Theologie,Band 1, 1988, 11
[4] W. Pannenberg, Systematische Theologie, Band 1, 1988, 11-18쪽
판넨베르크/정용섭 옮김 출처: 대구성서아카데미
[5] Desidero ergo sum(라캉) : on the metaphysics of desire in Felisberto Hernández's "Las Hortensias" Mann, Niall B. 2011
'4, 신앙과 신학, 그리고 과정신학( Process theolog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 과정신학(Process theology)- 2. 과정철학 (0) | 2021.02.21 |
|---|---|
| 5. 과정신학(Process theology)- 1. 학문적 배경과 인물들 (0) | 2021.02.16 |
| 3. 그렇다면 종교적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0) | 2021.01.28 |
| 2. 신앙(信仰: Faith, 믿음Believing)과 주장들 .... (0) | 2021.01.27 |
| 1. 신앙과 신학(들어가며) (0) | 2021.0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