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유명론의 선구자 중 하나인 콩피에뉴의 로스켈리누스는
술어, "인간"에 해당하는 별도의 추상적 속성 같은 것은 없으며,
그저 인간 한 명 한 명이 있을 뿐
'인간 자체'라는 것은 그저 "인간"이라는 말소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유명론(唯名論, nominalism)
형이상학에서 보편과 추상적인 대상을 거부하고
단지 일반적 혹은 추상적인 용어들의 존재만을 인정하고 단정하는 철학적 견해이다.
유명론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보편 논쟁의 하나이다.
실재론(實在論, Realism)혹은 "형이상학적 실재론"이란
"주관의 인식 작용과는 독립하여
외부에 세계나 자연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는 외부의 세계에 관해 말할 수 있고 또한 탐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리킨다.
의식, 주관으로부터 독립된 실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올바른 인식의 목적 및 기준으로 보는 관점이다.
실재의 유사성은 인정하지만 이해의 정확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는 관념론과 대조되는 견해로 볼 수 있다.
관념론(觀念論, idealism)은,
실체 혹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체는
근본적으로 정신적으로 구성되었거나 혹은 비물질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적 입장이다.
마음, 정신 혹은 관념을 중시하는,
혹은 근본적인 것으로 보는 철학적 입장들의 통칭이다.
관념론 : 오직 "정신/마음/영혼이라는 관념만이 존재한다"는 형이상학적 입장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유물론 : '오직 물질만이 존재한다.'
심신 이원론 : '물질과 정신이 둘다 존재한다.'
실재론 : '우리 "바깥에"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
유명론 : 추상적인 용어는 인정하나, 추상적 대상을 거부
.
그 제자인 아벨라르두스는 다만 물리적인 말소리 그 자체는 될 수 없으며,
말소리들이 공유하는 언어적 의미가 바로 속성의 정체라고 주장했다.
오컴의 윌리엄은 이런 선대 유명론자들의 핵심적인 통찰에는 동의하되,
우리가 말하고 쓰는 언어의 의미는 심적 언어(verba mentalia)에서 유래한다고 봤다.
곧 윌리엄에 따르면,
언어적 의미의 속성이란, 심적 언어의 개념(conceptus)이다.

언어철학(言語哲學)은 언어에 대해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이다.
언어의 본질과 기원,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 언어학의 기초 이론 등을 고찰하는 학문.
언어철학(言語哲學)은 말 혹은 언어에 관련된 철학적 문제들을 다루는 철학의 한 분과다.
경험과학으로서 언어를 탐구하는 언어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연구가 겹친다.
언어철학(Philosophy of Language)이 아니라
'언어학의 철학(Philosophy of Linguistics)'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인 언어 그 자체가 아닌,
언어학의 방법론이나 주제에 관련된 철학적 문제를 다루는 분야이며,
일반적으로 과학철학의 하위 분과로 간주된다.
당연히 이 문서에서 다루는 언어철학과 별개의 분과이니 혼동하지 말자.
언어가 사고와 세계관을 지배

언어에 관한 철학적 탐구는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베다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성이 있었던 인도에서는
기원전 시기부터 언어에 관한 철학적 사유가 깊이 발달하여
이후 힌두교의 6대 철학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한자문화권에서도 제자백가 중 명가는 초보적인 언어철학을 시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유럽 문화권에서도 언어(로고스)에 관한 철학적 사유는
파르메니데스의 작업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언어에 관한 철학적 논쟁이 본격화된 것은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가 등장한 이후였으며,
이는 소크라테스의 후예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더욱 발전되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름과 이름이 가리키는 것의 관계를 따지는 플라톤의 『크라튈로스(Κρατύλος)』가 있다.
이후 스토아 학파는 그런 언어적 탐구를 더욱 발전시켜 전통적인 문법에 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둔스 스코투스 및 오컴의 윌리엄 등 중세의 여러 스콜라 철학자들 또한 언어철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근대 이후에도 니체나 하이데거 등의 철학 체계에서 언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은 20세기 프랑스 철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언어철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논리학, 언어학과 본격적인 협업을 이룬 것은
프레게, 버트런드 러셀, 비트겐슈타인 등으로부터 출발한 분석철학 전통이었으며,
이는 21세기 현재 언어철학의 지형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언어철학은 넓게는 언어적 철학과 언어학의 철학, 언어의 철학을 모두 포함한다.
이 세가지는 근본적으로 서로 연관이 된다.
언어적 철학영어의 linguistic philosophy의 번역어.
(1) 드물게는 "언어 철학 philosophy"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2) 주로 20세기 영미권의 철학적 경향을 가리키는 분석철학과 유사어로 사용된다.
분석철학은 프레게의 논리학과 러셀의 언어 분석으로부터
방법론적 영감을 받아들인 철학의 유파로 볼 수 있는데,
철학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언어 분석으로부터 출발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언어적 철학에는 크게 논리실증주의와 일상철학, 이렇게 두 유파가 있었다.
러셀과 초기 비트겐슈타인으로 대비되며 콰인 등으로 계승된 논리실증주의는
(1) 경험적으로 실증가능하며
(2) 논리적으로 명확한 언명만이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며
언어비판에 의한 형이상학의 거부를 주된 모티프로 삼았다.
후기 비트겐슈타인, 라일, 오스틴 등과 그들의 후예들을 포함하는 일상언어철학은
논리실증주의의 좁은 견해를 벗어나 언어의 비지시적 사용에 대해서도 시야를 확대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분석철학의 발전은 다양한 흐름과 주제들이 공존하고 있다.
언어학의 철학언어학의 철학은 과학철학의 한 부문이다.
언어연구의 이론과 방법등이 주제이다.
언어의 철학언어의 철학은 언어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의사소통의 본질, 발화와 행위의 관계,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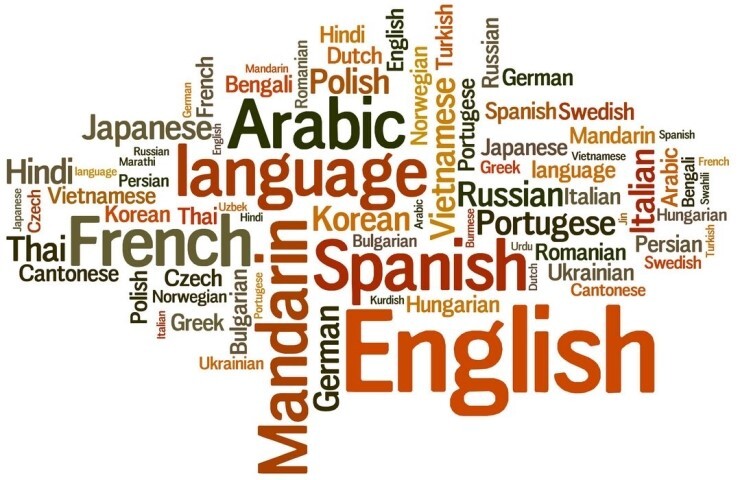
P. 15
일정한 종류의 표시와 소리가 의미를 지닌다는 것,
우리 인간이 이에 관해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철학적 의미 이론은 표시나 소리의 문자열이 유의미하다는 것,
특히 문자열이 어떤 효능으로 독특한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인간이 별다른 노력 없이 유의미한 발언을 만들어내고 이해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설명해야 할 것이다.
P. 71
‘그(the)’의 핵심적 사용이라고 간주한 것만 다루고, 복수 용법과 일반 용법을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이는 확정 기술 이론을 언제까지나 애지중지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쨌든 러셀은 맥락 사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기술 이론에서 왜 맥락 사용을 다루지 않는지 의아한데,
기술의 복수 용법과 일반 용법은 단칭 표현이 아니지만, 맥락 기술은 표면적으로 단칭 지칭 표현인 까닭이다.
P. 111
크립키는 어떤 이가 ‘닉슨’이라는 이름을 이 세계에서 한 사람을 지칭하려고 사용한 다음에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서 가상의 각본이나 대안 가능 세계
(hypothetical scenarios or alternative possible worlds)를 기술한다면,
그 사람은 같은 사람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닉슨이 대통령이 되지 않고 흑표범당에 합류했을 수도 있을까?
(Might Nixon have joined the Black Panthers rather than becoming President?)”라고 물으면,
대답은 ‘그렇다’일 수도 있고 ‘아니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려한 각본은 바로 그 사람, 닉슨이 흑표범당의 당원이라는 것이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가 흑표범당의 당원이었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흑표범당의 당원이 미국의 대통령인 세계를 상상하고 있지 않다.
P. 161
(1) 현재 영국의 여왕은 대머리다. 2017년에 우리는 엘리자베스 윈저가
러셀의 충고에 따라 가발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하면서 (1)은 거짓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대머리였을 수도 있거나 대머리가 될 수도 있는, 과거나 미래의 다른 여왕들에 대해서는 어떤가?
(1)을 대머리였던 어떤 선대 여왕의 재임기에 발언했다면 참일 테지만,
지금부터 수십 년이 지나 어떤 후대 여왕의 재임기에 발언하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그래서 (1)이 거짓인지 참인지는 언제 발언하냐에 달렸다.
P. 188
그라이스(Herbert Paul Grice, 1913~1988)는
언어 표현이 오로지 표현이기 때문에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언어 표현은 명제를 ‘표현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고 문자 그대로
언어 표현을 사용한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나 의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의미를 지닌다.
그라이스는 ‘화자 의미(speaker-meaning)’라는 생각을 도입했다.
어림잡아 말하면 화자 의미는 화자가 특정한 기회에 주어진 문장을 발언할 때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의도한 것이다.
P. 244
“존스는 한밤중에 구운 빵에 버터를 발라 먹었다”는 참이다
iff (∃e)(버터바름(e) & 주인공(존스, e) & 희생물(구운 빵, e) & 발생-때(e, 한밤중))
이 T-문장의 오른쪽 항은 흔히 다음과 같이 읽는다.
“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구운 빵에 버터를 바름이었고,
존스가 한밤중에 수행한 것이었다.”
데이비드슨은 행위자인 존스가 아니라 전체 사건을 바탕에 놓인 주어로 만듦으로써,
왜 표적 문장이 “존스는 버터를 발랐다”, “구운 빵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한밤중에 어떤 일이 생겼다” 같은 단순 문장을 함의하고,
이 함의들을 달리 포착하기 어려운지 설명할 수 있다.
P. 311
평서문(declaratives)은 다른 효력도 역시 가지면서 발언할 수 있다.
만일 내가 (9)~(12)에서 각각 수행 어구를 삭제하고 단지 “우리가 … 을 지나치게 확장한다”,
“위원회는 … 에 투표했다” 따위로만 같은 맥락에서 말한다면,
그런 발언은 각각 판단, 보고, 충고, 경고의 효력을 가질 것이다.
오스틴은 이런 유형의 특징을 ‘발화 수반 효력(illocutionary force)’이라고 불렀고,
‘발화(locutionary)’ 내용이나 명제 내용과 대조했다.
P. 404
은유에 관한 주요 철학적 문제는 두 가지다.
넓게 해석한 ‘은유적 의미’란 무엇인가?
그리고 은유적 의미는 어떤 기제(mechanism)로 전달되는가?
다시 말해 청자들이 들은 것이 문자에 충실한 의미가 다른 어떤 문장일 뿐이라면,
청자들은 어떻게 그런 의미를 파악하는가?
은유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에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이유,
비유 화법으로서 은유의 독특한 효과와 힘,
삶의 몇 가지 방면에서 은유가 하는 중심 역할에 관해 중요한 철학적 문제를 여러 개 추가로 제기한다.

말은 의미를 가진다고 여겨지며,
특히 문장은 명제를 그 의미로 갖는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한국어 문장 '사과는 과일이다'와 영어 문장 'An apple is a fruit'은 의미가 같다.
그런데 이때 의미 혹은 명제라는 게 무엇인가?
물리학적으로 의미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의미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같은 것인가?
의미는 뇌에서 발생하는 특정 전기 신호에 지나지 않는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그리고 문장 전체의 의미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의 의미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의미가 문장의 진리조건(Truth Condition),
즉 그 문장이 참이 될 필요충분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무언가라는 점은, 많은 철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안이다
(예. 문장 '사과는 과일이다'는 사과가 과일일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참이다).
하지만 여러 언어 현상을 볼 때 '의미'라는 개념을
진리조건과 똑같은 것으로 보는 입장은 많은 난점을 낳는 문제가 발생한다.
언어철학은 '의미'의 본성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형이상학과 밀접히 연관되며, 동시에 '의미'는
우리가 마음으로 '뜻하는 바'와 깊은 연관을 맺는 것으로 보이기에
심리철학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비트겐슈타인의 주저인 『논리-철학 논고』와 『철학적 탐구』 등을 처음 접하면
대개 영적인 삶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갑고 기술(技術)적인 철학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의 성격과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 차가움과는 다소 동떨어져 보이는 것들이 보인다.
비트겐슈타인은 한때 수도자가 되려고 했고,
자신의 재산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으며,
금욕적이며 은둔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고자 했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맹목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것을 북돋웠으며,
자신의 책 중 하나에 ‘신의 영광을 위해 쓴’(PR 7)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인상적인 특징은 사후 발견된 종교적 믿음과 실천에 대한 독특한 글들과 함께,
사후 50년 동안 그가 종교철학과 신학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트겐슈타인과 그의 작품에서 그런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은 그 질문에 답을 찾는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삶과 그의 위대한 두 저서
『 논리? 철학 논고』와『 철학적 탐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그의 전후기 철학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 설명한다.
그 다음 2장에서는 종교의 본성과 ‘신비한 것’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생각들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주술, 최후 심판, 신과 같은 문제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이 심사숙고해 쓴 글들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말콤(Norman Malcolm)과 필립스(D. Z. Phillips)를 포함한
몇몇 비트겐슈타인의 후예들이 제시한 종교철학을 살펴보며,
특별히 언어놀이들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주의자들의 논의와 기적과 불멸 같은 문제에 대한 적용을 평가한다.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비트겐슈타인에게로 다시 돌아와,
주류 종교철학 그리고 최근의 진보 신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종교에 관한 비트겐슈타인의 설명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양립 가능한지에 대해 숙고해 본다.
'나린푸실 이야기 > 철학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존재, 언어, 사건 (0) | 2022.03.12 |
|---|---|
| 언어철학 - 2 (0) | 2022.03.04 |
| 버트란트 러쎌-2 (0) | 2022.02.15 |
| 행복 - 버트란트 러쎌 (0) | 2022.02.15 |
| [종교의 통섭] 종교, 인문으로 치료하다. (0) | 2022.0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