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며
- 시대 시대마다 시대적 패러다임과 시대적으로 내려오는 하이라키적 차별적 분위기와 그런 배경하에서 만들어진 신학적 사고는 마치 왕들의 통치시대(Monarchy)의 the Kingdom of God과 오늘날 21세기에는 시민주권시대(The age of civil sovereignty) 에는 the People’s Nation(of GDD)이라는 개념차이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신정시대나 왕정시대 에는 각 나라 민족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달랐고 또 모든 것은 신의 뜻으로 심지어 전쟁으로 각자의 신의 파워를 가늠하기도 해서 신정정치시대의 패배자는 승리자들의 신을 섬겼다.
.

1. 앞서 언급했듯이 신앙이란, 시대적으로 이미 인정된 것에 대한 확신과 동일하다.
'신앙'이라는 단어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종교적이거나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것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믿음이나 신념, 신의를 포함하는 신앙이라는 개념은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뜻이 담긴 것이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특히 어떠한 신앙(믿음)이든, 타의(他意)에 혹은 자의(自意)에 의해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누리며 결국, 자신의 책임으로 결말을 보게되는 아버지(Arche, 造物主, the creator)를 향한 인간의 의지이다.
2. 신학(神學,Theology)은 하나님(神)을 자신의 언어속 개념으로 관념화 시키는 작업이라고 앞서 언급했지만,
그렇게 인간의 언어속에서 생성되어 시대적, 상황적으로 정해져 버린 ‘개념화 된 하나님(Conceptualized GOD)’,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라는 근원(Arche)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까? 고대 그리이스에서 Theos는 주어로 쓰이지 않고, 술부에 쓰여 어떤 주제에 최상을 말해 주는데 쓰였다고 한다. “그것이야말로 Theo (최상, 최고)야~”라고 말이다. 모든 역사적 신학적 주장들은 그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 또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하여 나온 것이다. 말하자면 훗날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종교로 공인 받았을 때부터 교회와 사회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지 않았던 Theos(신, 하나님, YHWH, God)가 주어가 되어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말이 된다.
3. 그러므로 어떤이의 한 가지 신학적 주장을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한 진리라고 주장하는데서 부터 문제가 발생하며 종교(교회)의 비극이 시작된다. 어떤이에 의해 세워진 진리가 시대를 초월하여 주장을 하는 한, 그 신학적 사고로 말미암아 교회와 사회를 죽여버리게 되고 만다. 그말인 즉슨, 신학은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다는 말이다. 신학이라는 것이 어느 인물의 소유물 처럼 여기고 거기에 매몰 되었을때 종교의 비극으로 나타난다는 말이다.
4. 그 많은 역사적 사건들 중에 한 예를 들면, 주후 AD3~4세기의 북아프리카 전역에 세워진 카톨릭 교회 …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이고 그럼에도 예수를 맞이하는 환호와 함께 순종하며 북아프리카 전지역으로 성장하던 "도나투스-교회"가 서로마제국과 북아프리카 도시들속의 가진 자, 있는 자들의 차별과 부패 그래서 생겨나는 타락으로 물든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카톨릭 제국"의 신앙과 신학에 결국 무너져 당시, 교회사-역사적으로 가장 규모가 컷던 도나투스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살해되거나 훗날, 북아프리카에 밀려온 이슬람의 바다 속으로 스스로 투신했던 역사적이고 교회사적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신앙과 신학이라는 화두를 되새김질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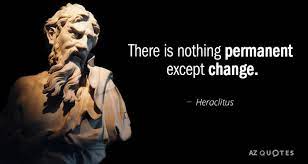
5. 필립 클레이튼(Pillip Clayton)의 책 “신학이 변해야 교회가 산다(Transforming Christian Theology)”에서 저자가 깨달은대로 “ ’신학함’이라는 것은 옛것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 생각하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신학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한다. 그것도 의문과 함께 말이다. 그래야 어떤이가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그 신학 전문가 계층에 맞대어 바로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사회가 세워져야 지금의 현대신학적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예수 가르침으로 베드로가 배에서 튀어 나와 물위를 걸었듯이 말이다. 그 말은 기독교 신학이 변해야 한다는 말의 궁극적 결론이 신학이라는 지적 암기가 아니라,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신학, 그 열정적 대화속에 있는 각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 되었는가?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1]
6. 동양사상으로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 “명가명 비상명”(名可名 非常名) 이라는 노자사상이 있다. 여기서 도(道)는 사물의 존재를 의미한다. 영원할 수도 있지만, 불변(常道)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싯달타가 보리수 나무아래 6년간의 고행끝에 무상(無常)을 깨달았고, 그리고 ‘불’이라는 원소 개념에 의해 만물은 순환된다고 하며 그렇듯이 "만물은 움직이고 있어서 무릇 모든 것이 머물러 있지 않고, 만물이 유전(流轉)한다.”라고 주장한 ‘에베소’의 고대 그리이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 500년후 AD53년경 사치와 환락의 그 도시에 기원후 53년에 도착하여3년간 머물면서 켈수스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하나님의 변화(에베소서 4: 4-6)를 말하며 기독사상을 가르치던 바울(Paul)과 로고스(Logos)의 변화(요한복음1장1-10)를 말하던 요한(John) ….그리고 Old Testment의 전도서에 전반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To Everything turn turn turn ~”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저자는 노래하고 있다.
7. 고대 철학자 탈레스,아낙시만드로스,아낙시메네스가 그동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알 수도 없는 신비의 존재에 대한 우주적 규명을 위해 처음으로 최초의 본질 (Arche)에 다가간 것처럼, 인문학으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철학하는 것’, 그 자체가 학문을 말하듯이 이런 사고를 따라 Arche를 찾아가는 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 자유, 정의, 진리, 평화 등등이 길(道)을 의미 하듯이 말이다. 바로 그 길(道)이 Arete(德)를 품고 있다. 예수가 말했다고 요한복음14장 4절에 쓰여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도, 생명도, 인생도… 그 언어안에 길(道)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언어에 머물러 있지말고 반드시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가야, 미덕美德 (Virtue, Arete(=ἀρετή)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8. 신론(神論)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쟁점을 고전적 신학자들은 상황신학자들에게 거의 2천년간 내려오는 신학적 사고를 제시(강요)한다. ❶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가? ❷성육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가? ❸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며, 영원 불변한가?(하나님의 본성과 사역) ❹전통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족적이고 불변적인 존재로 외부의 영향과 무관하다. 따라서 고통이나 슬픔, 그 감정들을 가질 수 없다라는 무감각성 (무고통성) 의 교리라는 것이다.[3] 하지만, 고전적이고 복음적이고 정통적인 신학의 성서적 근거라는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과 불변성과 하나님의 천지창조, 예수의 신성(神性,Divinity), 구속적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삼위일체와 육체적 부활교리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과정 철학이라 했는데[2] .........
9. 그것에 대한 동양사상이 있다. 생성(존재)-소멸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과정철학이 대두되기 이전에, 본체보다 작용을 중시하는 명나라때 철학자 왕부지(王夫之)는 행(行)이 지(知)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긍정했다. 그는 〈상서인의 (尙書引義)〉 제3권에서 "지(知)라는 것은 진실로 행(行)함으로써만이 그 공(功)이 되는 것이며, 행(行)이라는 것은 지(知)로써 공을 삼는 것은 아니다 “ 라고 화이트 헤드나 존캅등의 앎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결국, 실천으로 존재한다는 말과 같다. 그 둘의 상호작용은 중용(中庸)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중용 21장, 自誠明(자성명) 謂之性(위지성), 自明誠(자명성) 謂之敎(위지교), 誠則明矣(성즉명의) 明則誠矣(명즉성의)…. 정성스러움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성性의 작용이라 하고 밝음으로 말미암아 정성스러워지는 것을 교敎의 효과라 한다. 정성스러우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정성스러워진다.”
- 시대 시대마다 시대적 패러다임과 시대적으로 내려오는 하이라키적 차별적 분위기와 그런 배경하에서 만들어진 신학적 사고는 마치 왕들의 통치시대(Monarchy)의 the Kingdom of God과 오늘날 21세기에는 시민주권시대(The age of civil sovereignty) 에는 the People’s Nation(of God)이라는 개념차이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신정시대나 왕정시대 그리고 각 나라 민족마다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Guardian God)이 달랐고 또 모든 것은 신의 뜻으로 심지어 전쟁으로 각자의 신의 파워를 가늠하기도 해서 신정정치시대의 패배자는 승리자들의 신을 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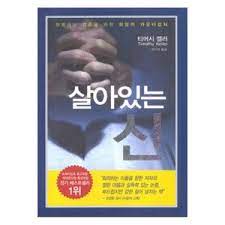
10. 기독교에서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살아있는 신이라 한다. 그 신은 어떤이가 생물로 인격화, 개념화 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시대적인 패러다임에 의해 변화되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이치(理致)요, 도리(道理)다.
화이트 헤드(Alfred N. Whitehead)의 저서, “과정과 실재 (Process and Reality)” 라는 형이상학적 체계로 사고해 보면, ‘살아계신 주’(主,Lord)라는 이 말은 즉, 하나님도 생물이라는 관점이므로 시대 시대마다, 새로운 의미의 개념이 생성되어야 하고 또 그리되야 마땅히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다. 성서 마태복음 16장 15절, 민중들에게서 듣고온 제자들이 예수를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아등의 화신으로 생각한다고 하자,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 하십니까? But who do you say that I am?”라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되 묻습니다. 바로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 따라서, 그들에게 각각 개념화 된 예수를 상상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개념화 된 하나님 (conceptionalized God)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믿음은 고정되어 굳건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적 사고에 의하면 시대적으로 그 개념은 일시적인 변화이고 다시 그 개념은 소멸되고 다시 새로운 개념이 대두된다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것은 변천한다고 헤라클레토스나 성서의 전도서나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았다는 싯탈타의 깨달음, 무상(無常)함 처럼, 모든 (무)생물이 변화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이라는 개념도 변화해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인간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에 대한 개념 역시 시대에 따라 변화 되어야 마땅한 일이고 논리가 아니겠는가? ”시대에 따라 개념화 되어진 하나님”(the Conceptualized God in each age)이라고 정리한 폴 틸리히(Paul Johannes Tillich, 1886~1965)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말하자면, 신정시대인 모세시대때, 에스라 시대때…. 왕정시대인 어거스틴때, 루터 칼빈 시대때, 그리고 시민주권시대인 오늘날 .... 시대적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에 따른 개념이 다르지 않겠는가?

11. 그리고 같은 차원에 개미가 사람을 규정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차원이 다르고 그래서 지각이나 모든 면에 견주어 볼 수 없는 차이가 엄청 나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규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 아무리 가르쳐도 당시까지 내려오는 전통과 제도라는 배설물과 같은 구습의 지식(?)에 쩔어 도무지 예수-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던 예수, 사방이 트여있는 갈릴리 바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평(地坪)위에 떠있는 구습의 배설물로 가득찬 배 안에서 부터 신학(Theology)과 교회가 튀어나와 물위를 걸을 수 없다면, 다시 말하면 ‘새 술은 새 부대에(마9:17)’ 라는 예수 가르침에 따른 시대적 변화의 패러다임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또 다르게 말하면, 2천년전의 다메섹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예수의 가르침을, 21세기 패러다임에 맞출 수 없다면 바른 신앙이 없는 모든 종교, 모든 종교의 신학은 물론 종교 그 자체의 비극은 계속 될 것이다.
If in anything you have a different attitude, God will reveal that also to you.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신(神)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15)

We are all atheists about most of the gods that Humanity has ever believed in. Some of us just go one god further. I am against religion because it teaches us to be satisfied with not understanding the world.
― Richard Dawkins, The God Delusion
신과 믿음, 루돌프 불트만(Rudolf Bultmann)
[1] 필립 클레이튼, 신학이 변해야 교회가 산다,(신앙과지성사,2012,서울)280
[2] 유재인, 상황속의 신앙과 신학(과정신학) 강의안
[3] Ibid

'4, 신앙과 신학, 그리고 과정신학( Process theolog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7. 참조자료 (0) | 2021.03.23 |
|---|---|
| 설교 포인트 (0) | 2021.02.22 |
| 5. 과정신학 -3. 특징 (0) | 2021.02.21 |
| 5. 과정신학(Process theology)- 2. 과정철학 (0) | 2021.02.21 |
| 5. 과정신학(Process theology)- 1. 학문적 배경과 인물들 (0) | 2021.0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