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슐라이어마허 (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
ㅡ 독일의 루터교 목사이자, 베를린대학교 신학교수를 역임한 신학자이며, 철학자이다.
▪︎출생: 1768년 11월 21일, 폴란드 브로츠와프
▪︎사망: 1834년 2월 12일, 독일 베를린
▪︎학력: 할레 비텐베르크 마르틴 루터 대학교
▪︎임마누엘 칸트, 플라톤, 프리드리히 빌헬름 요제프 셸링 등에게 영향을 받았고,
▪︎빌헬름 딜타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루돌프 불트만, 폴 틸리히 등에게 영향을 끼쳤다.
1. 슐라이어마허는 교부신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집대성한 근대 신학의 아버지이자,
<칸트 철학의 한계를 극복한> 초기관념론과 초기낭만주의 철학을 주도한 사상가이다.
2. 고전문헌학자로서 플라톤 전집을 독일어로 옮겼으며,
독일 문화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문화철학자>였고,
베를린 삼위일체교회의 설교자로서 국가와 교회의 개혁을 주도한 실천적 지성인이었다.
주요 저서로는 ‘종교론’, ‘기독교신앙’ 등이 있다.
3. 그는 계몽주의, 경건주의, 그리고 낭만주의의 영향을 통해 현대 자유주의 신학를 탄생시켰다.
그는 또한 보편 해석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4. 개신교 정통주의에서 주장한 성서영감설에 따른 성경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신학이 아니라
신앙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관과 감정을 근거한 신학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5. 그의 신학 접근법과 방법론이 현대 기독교 사상에 끼친 그의 깊은 영향력 때문에,
그를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로 보기도 하며,
또한 개신교 신학을 슐라이어마허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며,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를 극복한 개신교 근대 신학의 문을 열었다고 본다.
6. 칼 바르트로 대표되는 20세기의 신정통주의 운동은,
그의 영향력을 넘어서기 위한 여러 방식의 시도 중 하나이었다.

■ 생애
1. 슐라이어마허 (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 1768~1834)는
실레시아에 있는 브레슬라우에서, •개혁교회 (The Reformed Church, 칼뱅주의 개신교)에 소속된
프로이센 군목의 아들로 태어났다.
2. 할레 근처의 바비와 루사티아 북부의 니에스키에 있는, 모라비안 학교에서 교육 받았다.
그러나 경건주의 성격의 모라비안 신학은 날로 늘어만가는 그의 회의를 해소시키지 못했고,
그의 아버지는 마지못해서 그에게 할레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주었다.
3. 당시 할레 대학교는 이미 <경건주의를 포기>했고,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볼프 (Friedrich August Wolf)와 요한 잘로모 젬러 (Johann Salomo Semler)의
이성적인 정신을 채택하였다.
4. 신학생으로서 슐라이어마허는 교과과정과는 별도로 나름의 책읽기에 전념했으며
<구약성서와 중동 지역의 언어에 대한 공부를 무시>했었다.
그러나 제믈러의 강의에 참석하면서 신약성서에 대한 <역사비평>을 공부하게 되었고,
요한 아우구스투스 에버하르트의 강의를 통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5. 1796년 독일 루터교 목사가 되어 베를린으로 옮겨 갔으며,
그곳에서 철학자 슐레겔 등 <낭만파>학자와 문학가들의 영향을 받았다.
6. 그는 '종교론'에서 <종교의 본질>은 행위도 이성도 아닌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독일 민족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로 <루터 이후 최대의 설교자>로 알려졌다.
베를린 대학교 설립에 참여했으며, 베를린대학교 신학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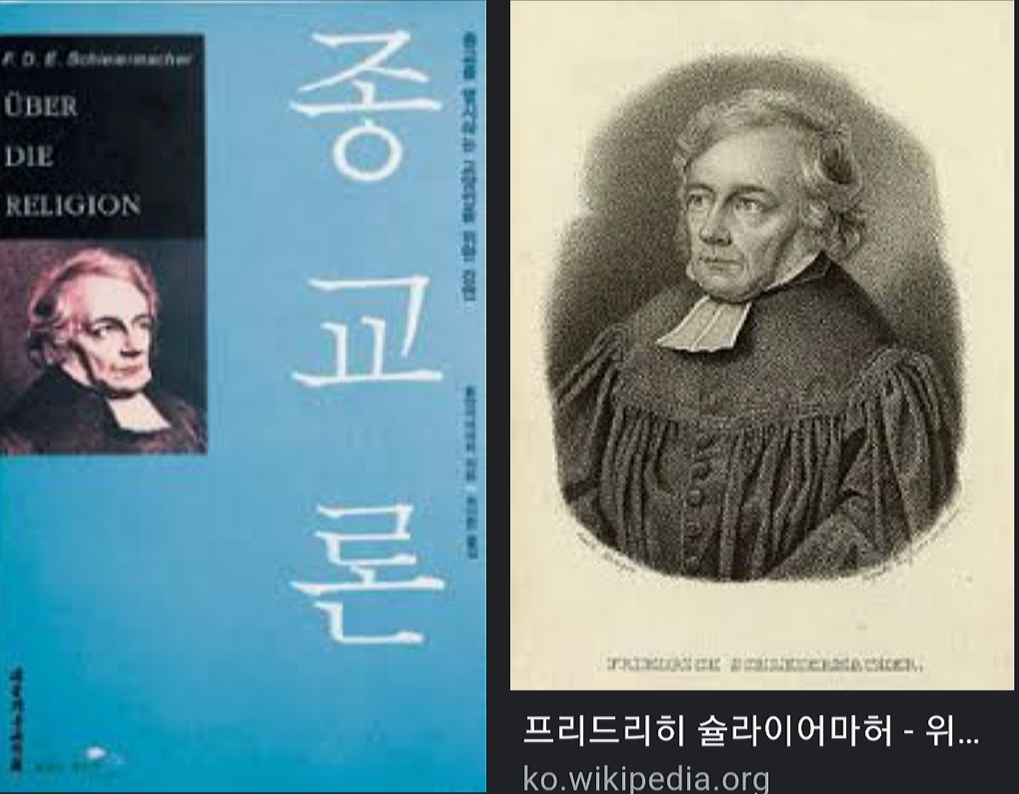
■ 종교 체계
“나는 슐라이어마허의 낭만주의 신학을 일생동안 진지하게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의 신학을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 칼 바르트
1 슐라이어마허는 근대신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작품은 '종교론' (1799년, 기독교 변증서)과 '신앙론' (1821/22; 2판: 1830/31)이다.
2. 우선 그의 '종교론'에서 근대신학이 정초해 놓은 새로운 방향정위를 살펴볼 수 있다.
20세기의 새로운 신학적 사상들은 슐라이어마허와 비판 대화를 시도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오늘날 슐라이어마허의 신학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3. 슐라이어마허의 신학적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 슐라이어마허는 인간을 “주체”로 생각한 최초의 신학자이다.
2) 여기서 주체 (subjectum)은 모든 것을 지탱하는 근원을 뜻한다.
3) '주체'로서의 인간은 모든 삶과 사유의 중심이면서, 모든 것은 바로 그 자신에 의해 이끌어져야 한다.
4) 따라서 주체로서 인간에게 종교란 외부의 어떤 힘에 굴복하거나 순복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슐라이어마허의 종교는 교리를 중요시하는 정통주의와 결별한다.
5) 이로써 그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가 된다.
4. 슐라이어마허는 당시의 철학적 사상을 수용한다.
스피노자의 범신론적 사유를 요약하는 '자연과 함께 하는 하나님' (deus sive natura, 데우스 시베 나투라)를
그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5. 따라서 그는 ‘신’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우주’에 대해 말한다.
또한 그는 ‘세계정신’, ‘인간성’, ‘역사발전’과 같은
당시의 정신사의 보편 기반을 확보하고 있던 개념들을 수용한다.
6. 슐라이어마허는 종교를 인간의 종교 체험과 감정으로 생각하였으며,
기독교의 전통 교리와 신앙고백 (Creeds)를 절대시하지 않았다.
신학보다 인간의 종교 체험과 감정을 더 우선시한 슐라이어마허의 신학은
대 자유주의 신학의 주요 특징중 하나이기도 하다.
7. 슐라이어마허는 단지 시대의 아들만은 아니었다.
그는 당시의 개념들과 정신사 작업들을 수용하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로써 슐라이어마허에게서 시작되는 근대신학은 근대정신을 수용, 비판하는 신학이다.
■ 해석학
ㅡ 근대에 ‘보편적 해석학’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단연 중심인물로 거론되는 사람이 슐라이어마허이다.
1. 해석학의 역사에서 특히 슐라이어마허의 보편 해석학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전의 신학적 해석학이나 문헌학적 해석학과 같은 해석학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좀 더 보편적인 지반에서 해석과 이해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2. 근대 이전 필론,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에 이르기까지 성서 해석학의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었던 비유적인 해석 방식에 슐라이어마허는 회의를 품게 되었다.
3. 비유적 해석은 텍스트의 본래적 의미 이외에
비본래적 의미를 받아들이는 한계를 노정(路程)하고 있는 것이다.

1906년 3월 31일 독일 바덴의 메쓰키르히 에서 태어났으며,
1951~1973년 프라이부륵 대학교에서 종교철학 교수로 봉직하였다.
1983년 9월 6일 사망하였다.
숙고되어야 할 문제의 존재를 숙고한다는 것은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존재와
비본래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 사이의
구별에 대한 비판적 물음을 포함한다.
가톨릭 신학과 현대철학 사이에 가교를 놓으려 했던 벨테의 사상적 노정은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 안셀무스 가 표현하였던 유명한 정식, 즉 “통찰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벨테에 의하면 종교철학은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뿌리와 전제들에 충실하면서도 순수한 철학적 사유의 특성을 견지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확신은 동향인 하이데거의 경우에서처럼 현상학적으로 뒷받침되었다.
4. 만인을 위해 쓰인 성서를 더 이상 신앙과 은총이 아니라
문법적이고 심리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을 절감한 슐라이어마허는
이전의 전통과 동시대인들과의 활발한 지적 교류를 통하여 해석학과 비판의 체계를 수립하게 된다.
5. 빌헬름 딜타이는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
"슐라이어마허에 의하면,
1) 해석은 하나의 구성 과정이다.
구성은 규칙(Regeln)을 잘 적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석자의 재능 (Talent)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해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문법적 해석이다.
2) 이것은 저자의 언어 영역권 안에서 텍스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과
단어의 의미는 전체적인 문맥(Kontext)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배후에 깔고 있다.
3) 텍스트의 해석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또한 중요하다.
심리적 해석은 저자의 기본 생각과 본래 의도에 비추어 텍스트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요청이다.
저자에게서 우리는 자아, 품위, 자율, 자유, 자발성과 같은 심리적인 근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해석자의 예감(Divination)은 해석자의 근원을 추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자의 심리적 상태 파악은 물론 저자의 전체적 저술에 비추어
하나의 작품을 통찰함으로써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
5) 슐라이어마허의 ‘저자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근거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절대 의존 감정으로서의 종교
1. 슐라이어마허는, "종교론"에서 자신의 신학사상을 펼치게 되는데
이는 당시 종교에 대한 관점들을 비판하면서 출발한다.
2. 당대 지식인들에게 종교는 제도, 관습, 교리,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감정 안에 그 본질이 있다고 했다.
3. 헤겔은 종교를 지식이나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나
슐라이어마허는 이런 헤겔의 관점을 비판한다.
또한 칸트와 같은 이성적 관점하에서의 종교관도 반대한다.
4. 종교론
슐라이어마허는 종교는 바로 절대자에 대한 절대 의존적 감정으로 표현했다.
그의 종교론에 의하면, 종교란 우주에 대한 직관과 감정이다.
여기서 우주는 '부단한 힘과 작용 속의 우주'를 일컫는 말로,
한계도 없고 멈추지도 않는 절대적인 힘의 흐름이며, 인간은 우주의 힘과 작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종교에서 자유의지는 당연히 무의미하며 도덕이나 형이상학과 같이
인간의 감각과 이성,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는 것과도 무관하다.
■슐라이어마허의 신학의 학문성 분석 : 종교론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of Schleiermacher's Theology : Focused on Religion
by 진성철
==>이 논문은 종교론을 통해 슐라이어마허의 학문성과 그 수단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그의 신학을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 계몽주의의 학문성은 이성에 근거하고, 칸트의 실천철학의 학문성은 실천-도덕-에 근거한다.
그러나 슐라이어마허는 종교론에서 이성과 실천의 방법의 한계를 지적한다.
2. 종교는 무한자에게 나아가는 것인데,
이성이나 실천의 방법만으로는 무한자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종교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이성, 실천의 개별적인 수단이 아닌,
이성, 실천, 감성, 오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인간성(Menschheit)'에 근거해야 함을 드러낸다.
3. 이러한 슐라이어마허의 학문적 방법은 그의 학문성이 이성이나 실천의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성과 실천의 방법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서,
계몽주의의 방법을 계승하는 '인본주의적인 수단'의 최고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슐라이어마허의 학문적 수단은 종교적 '직관 (Anschauung)'과 종교적 '감정 (Gefül)'이다.
그는 먼저 종교적 '직관'과 종교적 '감정'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5. 종교적 '감정'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것은 '직관'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관'은 인간 내면의 '인간성 (Menschheit)'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계몽주의의 '이성'이나 칸트의 '도덕-실천-'의 방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적 '직관'은 이성, 실천-도덕-, 감성, 오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전인(全人)적인 '인간성 (Menschheit)'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 수단이나 실천적 수단을 모두 수용한다.
6. 따라서 슐라이어마허의 학문적 수단인 직관 (Anschauung)과 감정 (Gefühl)은
이성, 실천, 감성, 오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전인적인 인간성 (Menschheit)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계몽주의와 칸트의 방법론들을 모두 포괄하는 수단인 것이다.
7. 종교론에서의 슐라이어마허의 신학은 계몽주의 신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계시가 아니라 인간성 (Menschheit)에 기반을 두고 있다.
8. 그는 종교론에서 성경Bible이 특별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면서, 인간성의 산물이고,
시대를 반영한 단순한 기록에 불과한 것이라고 정리한다.
9. 따라서 그는 인간성을 꽃피우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가치없는 '기록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계몽주의의 성경관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 성경관에 있어서 그가 계몽주의와 다른 점은,
성경이해의 잣대를 계몽주의의 인간 '이성'이 아니라,
'이성'을 포함하는 '인간성 (Menschheit)'에 둔다는 점이다.
11. 종교론에서, 슐라이어마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神)이 아니라,
신의식 (Gottesbewußtsein)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규정하고,
그리스도가 신의식의 능력으로 중보자 (Mittler)가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12.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불완전한 '인간성 (Menschheit)'을 일깨우는 사역이라고 규정함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속죄를 제외시켰다.
이러한 슐라이어마허의 기독론은 '역사적 예수 연구'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인간의 '이성'에서 '인간성'으로 옮겨놓은 특징을 잘 보여준다.
13. 슐라이어마허의 '인간성 (Menschheit)'의 수단이 21세기 개혁교회에 공헌할 수 있는가?
1)개혁신학의 통례를 따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올바른 방법'인 '종교'를 분류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객관적 종교'와,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주관적 종교'로 분류할 수 있다.
2) 여기에서 주관적 종교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의 '계시에 의존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슐라이어마허의 전인적인 '인간성'의 방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인간성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것이며,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4. 그러나 슐라이어마허가 제안한 이성이나 실천의 방법을 포괄하는 전인적인 '인간성'의 방식은,
성령에 의하여 변화된 인간 '성품'을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15. 신학하는 자가 '이성'이나 '실천-행위-'적인 방법들에만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전인(全人)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Schleiermacher's academic characteristic and academic methods, and to evaluate his theology through his major work, On Religion: Speeches to Its Cultured Despisers (1799). The academic characteristic of the Enlightenment finds its roots in reason. And the academic characteristic of practical philosophy of Immanuel Kant is rooted in the praxis-moral. In On Religion, Schleiermacher points out the limitation of the methods, that is the reason rooted in the Enlightenment and the praxis-moral by Kant. In his opinion, on the premise that religion is to approach the Infinite, he suggests that only a single method such as reason or practice alone cannot approach the Infinite. Therefore, to discuss religion, he states that his academic characteristic is based on human nature which includes reason, praxis-moral, sensuality, and intellect, not an independent method such as enlightenment according to Kant. Hence, his method is assessed as the best humanistic approach, inherited from the Enlightenment, because it not only overcame the limitation of reason or practice, but also included even the methods of reason and practice. Schleiermacher's academic methods consist of religious intuition (Anschauung) and religious feeling (Gefühl). He says that religious intuition and religious feeling are inseparable. Religious feeling does not exist alone and is dependent on religious intuition, and intuition is based on human nature and does not deny the methods of reason and praxis-moral. Rather, because religious intuition comes from the holistic human nature, which includes reason, praxis or moral, sensuality, and intellect, it includes methods of reason or practice. Hence, his academic methods, intuition and feeling, come from the holistic human nature and include all of the Enlightenment methods and Kant's method. Regarding Schleiermacher's theology, it is located on the extension of the enlightenment theology and its groundwork is not revelation but human nature. In On Religion, he defined the Bible not as the Word of God and special revelation, but as document reflecting the fruit of human nature and the age. Hence, he argued that the Bible is not an invaluable record for those who do not develop human nature. This is understandable that he inherited the ideas of the Enlightenment concerning the Bible. However, a difference is the standard of biblical understanding that is not rooted in the reason of the Enlightenment, but human nature which includes reason. Regarding Christology, Schleiermacher identified Christ not as God but as a perfect human being having God-consciousness (Gottesbewußtsei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God-consciousness, Christ was able to be an intercessor and was approved as God's son. In addition, by defining Christ's intercession as an awakening of an incomplete human nature, he excluded redemptive work from Christ's work. Hence, his Christology is located in the flow of the historical Jesus studies and it reveals that the standard of judgment about Christ shifted from human reason to human nature. In conclusion, how can Schleiermacher's approach of human nature contribute to Reformed churches in the 21st century? Reformed theology viewed religion as “the right manner of knowing and serving the true God” which consists of objective religion and subjective religion. In particular, given that subjective religion is a response of a man who was changed by the Holy Spirit, Schleiermacher's concept of human nature is not appropriate. From the viewpoint of Reformed theology, human nature is totally depraved, corrupt and not dependent upon God's revelation. However, we can partly accept his suggestions of the human nature approach, including practice and reason, under the premise of human nature changed by the Holy Spirit. It is appropriate for theologians to seek for a viewpoint not only depending on practice and reason but having a holistic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s approach to God.
○ 슐라이어마허의'종교론' :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 에 대한 연구 ㅡ by 김경덕
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슐라이어마허의 '종교론'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종교론'에는 내·외적인 의미 가 담겨있으며, 또한 그는 수사학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교론'은 대화체적이고 시적인 문체로 집필되었기 때문이다.
2. 그러기에 수사학적이고 대화체적이며, 시적인 문체의 의미로 인하여 그의 외적의미를 가지고 슐라이어마허의 사상과 '종교론'의 의미를 파악 하고자 하는 것은 피상적인 일이라 하겠다.
3. 많은 슐라이어마허의 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의 정치적, 종교적 배경일 것이다. 슐라이어마허는 계몽주의 시대로 볼 수 있는 18세기 중엽의 프로이센의 백성이었다.
4. 1814년 프랑스 역사학자인 <스테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일 지성인들의 생애와 사상의 관계를 사상적으로는 가장 대범하였으나 삶은 가장 복종적이었다고 묘사하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프로이센 지식인들의 이중성을 간파하였으며 그 결정적인 원인을 무력을 바탕으로 한 프로이센의 권위주의적 전제정치체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5. 이렇듯 당시 프로이센의 백성은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중적 이였다.
6. <필초오>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이 보수적인 세계에 반한 자유로운 힘을 대변한다면, 독일 낭만주의는 삼엄한 프로이센 정치·종교적 체제에 반한 투쟁이라고 선언하였다.
7. 이러한 정치·종교적 배경은 슐라이어마허에게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가 '종교론'을 검열을 통과하기 위하여 '무지'라는 필명으로 출판한 것과 '종교론'의 검열관인 자크를 생각해 볼 때 타당한 평가일 것이다.
8. 슐라이어마허를 가정이 개혁교회의 목사 가정이었던 것과 그가 후에 "보다 높은 서열의 모라비안 교도가 되었다." 라는 회심으로 인하여 그의 신학을 개혁교회적인 가정환경과 모리비안의 경건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9 . 먼저 개혁교회의 영향은 슐라이어마허의 아버지의 고백으로도 타당한 평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분명 아버지는 "믿지도 않으면서 설교해 왔다고"고백했던 것과 아들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영원한 형벌과 예수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 그리고 내세에 신자들의 보상 등의 교리를 믿지 않음을 알면서도 분명 목사고시를 보게 권했으며 또한 수사학을 가르쳤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0. 그리고 모라비안의 경건주의를 이야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슐라이어마허는 모라비안으로부터 출교당했음과 "모라비안교 내에서는 아무리 작은 직위라 할지라도" 구할 생각을 하지 말도록 정죄되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단언한 것을 볼 때 타당한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1. 또한 슐라이어마허의 철학적 배경을 플라톤과 칸트라고 말할 수 있을까? 슐라이어마허 아버지는 아들에게 플라톤과 스피노자를 모두 읽도록 조언한 것과 '종교론'을 완성한 후 <슐레겔>이 슐라이어마허에게 플라톤을 번역하자고 할 때 슐라이어마허는 그것을 "부적"이라고 이해한 것과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해서 '실천 이성 비판'을 "창녀"라고까지 비판했다면 플라톤과 칸트를 슬라이어머허의 철학적 배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12. 슐라이어마허는 분명 낭만주의자이며, 스피노자주의자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는 먼저 포우시트의 설교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크와의 관계에서 가능하며, 베를린에서의 헨리에테를 통한 "수요 모임"에 참여했던 것과 자신은 목사이면서도 낭만주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가까운 것은 그의 사상이 기독교적 목사의 사상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3. 또한 1827년 슐라이어마허는 심지어 그의 적대자 델부뤽에게 "지금부터 35년전 내가 최초로 "스피노자를 읽었을 때" 이후로 나는 진지하게 그를 찬양하며 사랑해 왔다."라고 고백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14. 그리고 슐라이어마허는 국가 종교인 기독교를 말살해야만 한다는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했었음을 통해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야만 한다.
15. 그렇다면, 슐라이어마허의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은 누구일까? 학자들은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이 당시 지식인들, 계몽주의자들 혹은 낭만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슐라이어마허의 낭만주의자들의 우정, 사상적 교류 그리고 낭만주의자들의 '종교론'을 쓰도록 권유한 것을 볼 때, 슐라이어마허는 결코 그의 친구들을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이라고 멸시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그러한 인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주었을 뿐이다.
16. 오히려 슐라이어마허는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을 국가 종교를 유일하고 참된 종교라고 신봉하던 기독교인들 특히 종교를 국가의 법이나 교리화하여 강요하던 교계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슐라이어마허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참 종교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17. 또한 만약 기독교를 "종교"라고 본다면 슐라이어마허와 동료 낭만주의자들은 국가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참 종교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했던 "국가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이었으며, 그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이해하기에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를 밝히려 했던 "교양있는" 종교인들이었다.
■종교론
= 210년 지난 지금까지 신학·철학에 큰 영향
목사이자 베를린대학 신학·철학교수를 지낸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의 '종교론'(대한기독교서회)은 근·현대 종교학의 시원(始原)으로 평가된다. 1799년 출간 당시 계몽주의의 합리적 종교관에 젖어 있던 독일 교양인들에게 도전하는 5개 강연으로 구성됐다.
이 책에서 슐라이어마허는 종교가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형이상학이나 도덕과 구별되며, 직관과 감정이 곧 종교의 본질이라고 강조한다. "종교는 형이상학과 같이 우주를 규정하고 설명하기를 원치 않으며…종교의 본질은 사유나 행위가 아니라 직관과 감정이다."(56쪽) 우주에 대한 직관과 감정 속에서 이뤄지는 제약자(유한자)와 무한자의 근원적 만남이 바로 종교라는 설명이다.
슐라이어마허는 또한 폐쇄적인 전통 교리나 교의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다른 사람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은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교는 노예의 봉사와 감금이 아니다."(109쪽) 그는 교의적 이해보다 실존적 체험을 통해 종교를 가질 것을 권유한다.
특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요한1서 4:18)는 점을 강조한 슐라이어마허는 기독교야말로 종교 중의 종교라고 강연한다. 유대교가 영원한 섭리를 심판으로 표상하는 반면 기독교는 이를 구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파멸, 그리고 고귀한 화해를 통한 지속적인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근본 직관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됐다. "신은 자신과 인간 사이에 더욱 숭고한 중보자를 세우고…자신과 인간을 더욱 내적으로 통일시키며 이로써 바로 이 신성과 인간성을 통해 영원한 존재를 알 수 있게 한다."(239쪽) 이에 따라 그는 계몽주의자들이 몰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독교가 앞으로도 긴 역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1768년 군목의 아들로 태어난 슐라이어마허는 할레대학에서 신학과 철학, 고전학을 공부한 뒤 할레대학 교수 및 목사를 역임했다. 또 베를린대학 설립을 주도했고 베를린 학술원 회원으로서 국가와 교회 개혁을 주도한 실천적 지성인이었다. 특히 그의 '종교론'은 종교가 교양이 없고 이상을 결여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당시 사상계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지금도 신학과 철학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재조명되는 고전으로 꼽힌다.
다만 종교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근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독자들에게는 어휘 등이 다소 난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성의 힘에 대한 신뢰로 종교와 절대자를 상대화시킨 당시 상황처럼 오늘날에도 종교는 여전히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슐라이어마허의 결론은 눈길을 끈다. "속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거죽과 외관에 집착하게 하라.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거하는 신을 사모하는 우리를 거절하지는 말라."(253쪽)
#슐라이어마허 , #자유주의신학의 아버지,

'나린푸실 이야기 > 신학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교 권력의 hieracky를 부수었던, 예수와 왈도(Ealdo) (0) | 2021.01.19 |
|---|---|
| ■예수 베들레헴 탄생을 부추기는 호구조사는 없었다. (누가2:1~3) (0) | 2021.01.17 |
| 일신교(一神敎 · Monotheism) = 다신교(多神敎, polytheism) (0) | 2020.11.10 |
| 성직자??? (0) | 2020.11.08 |
| (서평) 신학이 변해야 교회가 산다. (0) | 2020.09.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