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의 신 바알은 여러 지역에서 숭배되었습니다. 여호와는 그 중의 하나이다.”
<슈피겔 주간지 2002년 52호> DER SPIEGEL 의 Archiv(유료페이지)
원제목은, <Der leere Thron> 거짓말 성서...
바알(Ba'al)
가나안에서 풍요의 신으로 숭배를 받으며, 사람들의 섬김을 받았던 바알은, 높은 곳의 왕이란 뜻의 바알제불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 본래 이름은 하다드[Hadad, 아카드의 '아다드'] 입니다. 흔히 바알은 고양이와 인간 그리고 두꺼비의 머리를 지닌 모습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바알(Baal) - 지옥을 지배하는 대악마이자,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
바알(영어: Baal, Ba'al, 팔레스타인어로 '주인, 왕'이라는 의미)은,
고대 가나안인들이 숭배하던 풍요와 폭풍우(暴風雨)의 남신으로, 다른 이름은 하다드(Hadad)이다.
출토된 신상의 모습은 오른손에 창을, 왼손에 번개를 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구약성경에는, 아세라와 함께 대표적인 우상 중 하나로 나온다. 이와 같은 묘사는 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 이슬람교까지 이어져 바알은 대표적인 거짓 신으로 불렸고, 나중에는 베엘제붑(바알세불, 베엘제불)이라는 악마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심지어 이 베엘제붑은 외모가 당대 기독교 문화권에서 가장 더러운 동물로 여겨온 똥파리의 외모를 하고 있다.
Ba'al'이라는 영어식 이름은, 그리스 단어에서 파생하여 후에 라틴어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단어이다. 기독교가 유럽 전역에 전파되며 바알은 모든 거짓된 신들과 우상, 악마들을 통칭하는 이름이 되었으나, 바알이라는 이름은 고대에는 악마와는 거리가 먼 이름이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언어로는, 바알은 주인,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명칭은 신의 이름을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에, 마치 기독교의 '주님'과 같이 신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간접적으로 돌려 말한 것이다. 바알의 원래 이름은 '하다드'로, 고대 가나안 지방의 주요 신 중 하나였다. 그의 아버지는 최고신인 엘(El), 어머니는 바다의 신 아세라였다. 하지만 가나안 지방의 건조한 기후 때문에, 거주민들에게는 풍요와 다산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고, 따라서 최고신 엘보다 바알이 존경받았다. 배우자 신은 '아스타르테(아스다롯)'라고 알려지고 있다.
구약성서에서는 바알신앙과 야훼신앙이 경쟁관계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들(예언자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들간의 갈멜 산에서의 내기)이 나온다. 바알은 성서에서 이스라엘의 신(야훼, 하느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신 중 하나였는데, 바알 신은 원래 풍요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제 이름은 하다드(Hadad)이지만 대부분 바알 신으로 불렀는데,바알은 주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네요. 이처럼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지만, 그를 숭배하는 행위는 좀 독특하였는데. 흔히,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이 숭배라 여기게 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바알을 숭배한다는 명목아래 난잡한 성행위가 성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성행위를 통해 모든 것이 풍요로워 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인에게 신은 야훼(하느님) 오직 하나 뿐이 없었으나, 그 위쪽 지방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 동상 앞에서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인들에게 우상숭배라 여기게 되었으며, 특히 바알 숭배가 난잡한 성행위로 변질 되는것을 보며, 바알은 정의롭지 않은 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알은 풍우신(風雨神)계열에 속한다. ‘풍우신’은 문자 그대로 ‘비바람의 신’이란 뜻이다. 풍우신으로서 바알의 의미를 살펴보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토록 바알을 매혹적으로 생각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짧은 글은 고대 근동학이나 종교학적 정보보다는 신학적 시각에 충실할 것이다. 거룩한 권능의 비바람 최근 풍우신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슈베머(D. Schwemer)는 필자의 아카드어 선생이라는 각별한 인연이 있다. 슈베머에 따르면,
풍우신이 현현할 때 다섯 가지 자연현상, 곧 ‘비, 바람, 번개, 구름, 천둥’을 자주 수반한다. 이 가운데 두 가지 현상, 곧 ‘비와 바람’이 풍우신의 양면성과 거룩함을 대표하는 특성이다. 고대 근동인들은 기본적으로 농업과 목축에 의지했고, 그 시대에 비와 바람의 의미는 대단히 컸다. ‘바람’은 무척 강력하고 예측할 수 없는 힘이자 정치적 권력을 상징했다. 갑자기 몰아치는 큰 바람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대단한 파괴력을 지녔다. 하지만 ‘비’는 땅을 적셔 온갖 식물과 동물이 자랄 수 있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었다. 중동의 건조한 기후에서 비는 자비와 사랑의 상징이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모순되는 두 가지 속성, 곧 비와 바람은 인간과 자연의 생존을 결정짓는 필수 요소였다. 또한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서 신적 권능에 속한 것이라 믿었다. 그러므로 비와 바람을 한 몸에 지니고 자유롭게 부리는 풍우신은 ‘거룩한 권능(numinous power)’을 지닌 존재였다. 누구나 생존을 위해서 비바람의 신, 곧 풍우신에게 복종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비를 내려주어 생명을 키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들을 폭풍처럼 섬멸하는 풍우신만 믿고 따르면 생명과 안전과 풍요가 보장되리라 믿었다. 풍우신 신앙이 고대 근동 전역에서 확인되는 이유다.
풍우신의 번역 고대 근동 신화 연구의 초기부터 학자들은 바알 등이 현현할 때 비와 바람과 천둥과 번개 등이 자주 수반함을 보고했다. 1925년 독일 학자 슐로비즈(H. Schlobies)는 이런 종류의 신을 ‘베터고트(Wettergott)’라고 불렀다. 독일어 ‘베터(Wetter-)’는 ‘날씨’를 뜻하지만, ‘악천후’라는 뜻도 있다. 독일 등 북유럽의 기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뜻이 붙었을 것이다. ‘고트(-gott)’는 ‘-신’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이 신을 ‘날씨신’(또는 ‘기상신’)으로 옮기면 안타깝게도 오역이 되고 만다.
최근 영어로는 ‘폭풍우의 신(storm god)’으로 옮기는 추세다. 우리나라 일부학자들은 이를 줄여 ‘폭풍신’(暴風神)으로 부른다(필자도 이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러나 ‘폭풍신’으로 하면 또 오역이 되고 만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우리말 ‘폭풍’은 ‘매우 세차게 부는 바람’이요, 비슷한 말은 ‘왕바람’이다. ‘폭풍신’은 ‘비’의 요소를 포함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폭풍신’, 곧 ‘왕바람의 신’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정확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다시 펴보면, ‘풍우’(風雨)는 한자어로서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 첫째 뜻이 ‘바람과 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요, 비슷한 말로 ‘비바람’이다. 둘째 의미는 ‘바람과 함께 내리는 비’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풍우신’이야말로 ‘비바람의 신’의 양면적 성격을 직관적이고도 쉽게 나타내는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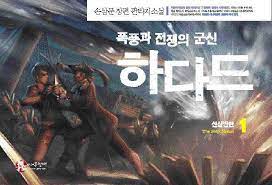
다양한 풍우신 풍우신 계열의 신들은 고대 근동의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대제국의 중요한 신들이 많다. 그러므로 풍우신 계열의 신들은 정치적 · 종교적 영향력도 매우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바알과 비슷한 속성을 지닌 풍우신들의 이름과 중요한 속성을 알아보자. 고대 근동학에 낯선 한국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풍우신 계열의 신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소개한다. 첫째는 고유한 풍우신들이고, 둘째는 풍우신의 속성을 후대에 흡수한 신들이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신들은 모두 중요한 신들로 하나씩만 다뤄도 많은 분량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나열한다.
고유한 풍우신의 대표 격은 수메르의 이쉬쿠르(dIskur)다. 이쉬쿠르는 아마 가장 오래된 풍우신으로서 풍우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슈베머는 풍우신이라는 현대적 개념으로서 풍우신으로 직역할 수 있는 낱말을 고대 근동어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그나마 가장 가까운 낱말을 고르라면 이쉬쿠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시리아·필리스티아의 도시국가들과 아시리아에서 섬겼던 하다드(Hadad), 후르인의 테슙(Tessub), 히타이트인의 타루(Taru)가 고유한 풍우신이다.
하다드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오래 섬겨진 풍우신이자 바알의 아버지로서 바알에게 비바람을 부리는 능력을 물려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다음 호에서 하다드에 대해 조금 자세히 볼 것이다. 한편 히타이트의 이웃이었던 고대 그리스의 토르(Thor)는 이름이나 속성에서 타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요즘 할리우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토르가 바로 이 신이다). 본디 풍우신은 아니지만, 후대에 풍우신의 일부 속성을 흡수한 신으로는 바빌론의 마르두크(Marduk)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다양한 도시국가들에서 널리 섬겼던 엔릴(Enlil)이나 닌우르타(Ninurta)도 여기에 속하고, 이집트의 세트(Seth)도 풍우신의 속성을 비교적 많이 획득한 신이다. 그리고 바알은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
바알은 풍우신의 거의 모든 속성을 흡수하여 ‘풍우신 바알’로 불려도 될 정도다. 이렇게 고대 근동 세계에는 다양한 풍우신이 존재한다. 풍우신은 지역과 시대에 적응력이 뛰어난 신이었고, 권력과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었으며, 고대 근동의 부강한 제국들에서 믿었던 중요한 신이었다. 후대에 풍우신의 일부 속성을 흡수하여 대중적으로 더욱 강한 영향력을 얻은 마르두크 같은 신들을 보면, 권력과 풍요를 약속하는 풍우신이 고대 근동에서 얼마나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도 여느 백성처럼 권력과 풍요를 열망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 백성의 일부가 외부의 화려한 세계에 눈을 돌려, ‘우리도 그들처럼’ 풍우신을 믿어서 더욱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는 말에 설득당했던 정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풍우신은 그만큼 매혹적이었고 대세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보편적 욕망’을 자극하는 신이었다. 그들은 시리아 · 필리스티아 지역의 강력한 풍우신이었던 바알에 마음이 끌렸을 것이다. 바알은 이스라엘인들의 눈과 귀로 가장 가깝게 체험할 수 있었던 풍우신이었다. 카르멜 산의 풍우신 경쟁 이런 풍우신을 이해해야, 카르멜 산에서 엘리야 예언자와 바알 예언자들이 대결한 ‘방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 대결은 풍우신 바알을 주님(야훼)께서 풍우신의 방법으로 승리하신 것이었다. 대결의 방법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시 말해, 번개가 쳐서 장작에 불이 붙으면 이기는 것이었다.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들에게 바알의 방식, 곧 전형적인 풍우신의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1열왕 18,24 참조). 이 방법을 채택한 것 자체가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 앞에서, 그 백성이 마음을 뺏긴 바로 그 방식대로 당신을 드러내시기로 한 것이다. 백성이 하느님께 다시 마음을 돌릴 기회를 주시고자, 자신을 낮추시어 역사에 뛰어드신 것이다. 엘리야는 하느님께서 ‘풍우신 경쟁’에 뛰어드신 이유가 당신 백성을 위해서임을 분명히 말한다(이하 1열왕 18장). “주님!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이 백성이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이시며, 바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주십시오”(37절). 엘리야는 제단 둘레에 고랑을 파서 물을 채우고 장작에도 물을 부었다(32-35절). 그리고 하느님을 불렀다. 그런데 결정적 장면에서 정작 그는 ‘풍우신 주님(야훼)’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36절)을 불렀다. 엘리야의 이 말은 주님(야훼)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다. 하느님께서는 풍우신적 대결에 응하여 승리하신 분이시지만, 본디 풍우신의 일종이 아니시다. 하느님께서는 먼 옛날 창세기의 조상을 선택하셔서 계약을 맺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신 유일한 하느님이시다. 구약성경은 주님의 대승을 이렇게 보고한다.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버렸다”(38절). 그리고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39절). 이렇게 대결과 승리의 동기는 풍우신적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런데 필자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더욱 흥미롭다. 카르멜 산의 승리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놀랍게도 비바람이 몰려왔다. 엘리야 홀로 비가 쏟아지는 소리를 들었다(41절). 그리고 종을 시켜 바다 쪽을 보게 했다(43절). 그러자 종은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올라옵니다.”(44절)라고 보고했다. 성경은 “잠깐 사이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캄캄해지더니, 큰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45절)고 보고한다. 풍우신 바알을 완전히 꺾은 다음에 주님께서 풍우신처럼 현현하시는 이런 장면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미 풍우신 바알은 몰락하여 무력한 존재가 되었고, 주님만이 가장 강하신 존재라는 것이다. * 주원준 토마스 아퀴나스 - 한님성서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고대 근동과 구약성경을 연구하는 평신도 신학자이다.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위원이자 의정부교구 사목평의회 위원이다. 저서로 「구약성경과 신들」과 「신명기 주해」 등이 있다. [경향잡지, 2017년 2월호, 주원준 토마스 아퀴나스]

(*야훼와 바알은 같은 존재인가?북부 자료에서 "바알"은 Omrides에 의해 소개된 페니키아 폭풍의 신을 의미합니다. 야훼의 한 형태로 이해되지만 선지자들은 이방인으로 거부한다. 그리고 어디서나 백성은 번개를 던진 바알의 발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모든 빗물 농업과 마찬가지로 레반트에 의존하는 민족들에게 기상의 신들은 판테온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Niehr는 말합니다.

주요 신은 처음에 번개와 창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의 여신 아세라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덴마크 전문가 Tilde Binger는 하늘의 여인을 주님의 "후배"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벗고 이상한 왕관을 쓴 것 - 이것이 다산의 아이콘이 된 방법입니다 - 사람들이 숭배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 당시에는 아세라 숭배 나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발견이 증거가 됩니다. 비문이 새겨진 작은 상아 석류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온 거룩한 제사장의 소유물".
홀 부착으로 해석되는 볼'은 기원전 7세기. 석류는 아세라 여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도 은혜를 입었다. 대제사장의 치마.
성경은 가나안 신들의 천국에서 만연한 이 소동에 대해 거의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저자들은 능숙하게 구원의 역사를 야훼와 그의 공성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귀엽지 않은 성전 검열에 의해 걸러진 뉴스. 그리고 그녀는 과장했습니다.
성경은 기원전 750년경으로 추정되는 방법에 대한 극적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 선지자 호세아 맹렬한 열심으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우상숭배를 가차 없이 좇았습니다.
엘리야가 강둑에서 죽이다기손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몰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장식된 역사의 해석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가정하지만그 당시 가나안에서 실제로 "여호와만 운동"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지지자들은 여전히 "주변 외부인"(Kinet)이었고 서서히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은 처음에 환상가들과 거의 관련이 없었습니다.
기원전 590년경 Chr도시의 부유한 시민을 묻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가슴에 구약의 축복이 새겨진 은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고양이 여신 Bastet의 부적도 우울한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의선지자 에스겔은 그러한 추종자들을 "똥물"이라고 부릅니다.
.<슈피 주간지 2002년 52호> THE MIRROR 의 아카이브(유료페이지)
Und überall warf sich das Volk dem Blitze schleudernden Baal zu Füßen. „Wie alle vom Regenfeldbau
abhängigen Völker standen in der Levante die Wetergötter im Pantheon ganz oben“, sagt Niehr,
„der Wettergott Baal wurde in vielen lokalen Varianten verehrt. Eine davon ist Jahwe.“
Mit Blitz und Speer wurde der Hauptgott anfangs dargestellt. Und er hatte eine Frau: Die Liebesgöttin Aschera.
Die dänische Expertin Tilde Binger nennt die himmlische Dame „Gemahlin“ des Herrn.
Völlig nackt und mit einer merkwürdigen Krone – so wurde die Ikone der Fruchtbarkeit von den
Menschen angebetet. Sogar im Tempel von Jerusalem muss damals ein Kultbaum der Aschera gestanden haben.
Als Beiwes dient ein sensationeller Fund. Es ist ein kleiner Granatapfel aus Elfenbein mit der Aufschrift
„heiliger Priesterbesitz aus dem Tempel Jahwes“. Die Kugel, gedeutet als Aufsatz eines Zepters, stammt aus
dem 7. vorchristlichen Jahrhundert. Granatäpfel waren Symbole der Aschera-Göttin. Sie zierten auch
den Rocksaum des Hohepriesters.
Von diesem Gewusel, wie es damals am Götterhimmel Kanaans herrschte, berichtet die Bibel kaum.
Geschickt spitzten ihre Autoren die Heilsgeschichte auf Jahwe und dessen Siegeslau zu. Missliebige
Nachrichten filterte die Tempelzensur heraus.
Und sie übertrieb. Dramatisch erzählt die Bibel, wie – angeblich um 750 v. Chr. – der Prophet Hosea
mit Feuereifer durchs Land eilte und unbarmherzig die Abgötterei verfolgte. Elija tötet am Ufer des
Kischon gleich 450 Baal-Priester auf einen Streich.
All das sind – später geschönte – Deutungen der Geschichte. Zwar gehen viele Forscher davon aus,
dass sich damals in Kanaan tatsächlich eine „Jahwe-Allein-Bewegung“ formierte. Doch deren
Anhänger waren noch „randständige Außenseiter“ (Kinet), die erst langsam an Einfluss gewannen.
Die Elite von Jerusalem jedenfalls hatte mit den Visionären anfangs wenig am Hut. Um 590 v. Chr. ließ sich
ein reicher Bürger der Stadt begraben. Der Tote trug zwar auf der Brust eine Silberplatte mit einer alttestamentarischen Segensformel.
Doch in der düsteren Gruft fand sich auch ein Amulett der ägyptischen Katzengöttin Bastet. Der
Prophet Ezechiel nennt solche Anhänger „Mistzeug“.
'나린푸실 이야기 > 역사(신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샌프란시스 폭동과 LA폭동 (0) | 2022.11.20 |
|---|---|
| 고대 그리이스 식민지 (0) | 2022.11.04 |
| 정여립의 대동세상 (1) | 2022.10.23 |
| Ottoman Empire, 오스만 제국 (0) | 2022.10.19 |
| 페르시아제국과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헬라(그리스)제국 (1) | 2022.10.18 |
